시카고의 외곽 도시 데스플레인즈. 1월의 첫 월요일 새벽 두 시,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미국에서는 저녁 아홉 시 이후에 전화가 걸려 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전화벨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울렸다. 이 시간에 전화벨이 울린다면 분명히 술 주정뱅이거나 잘못 걸려온 전화임에 틀림 없었다. 네 시간의 비행기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교인들과의 신년회, 잘못 걸려온 전화로 달콤한 휴식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멈추지 않는 전화벨.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꼭두 새벽에 안식일 교회의 목사를 찾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응급을 요하는 전화일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수화기를 들기 전에 결심부터 했다. "그래, 내용이 무엇이든2지 '예'라고 대답해야지." 수화기를 들었을 때, 한국 연합회에 계시는 홍명관 목사님의 낯익은 목소리였다. "권 목사, 필리핀에 있는 1000명 선교사 훈련원에 가서 일을 도왔으면 하는데...." 생각해볼 여지가 없었다. 대답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앞뒤를 가릴 것도 없이 대답부터 했다. "예, 가겠습니다."
1000명 선교사 운동과의 나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대답은 했지만 아침에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익숙해져 가는 미국에서의 생활, 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친절하고 능력 있는 선생님들(큰 아이의 담임 선생님은 세계적인 부흥목사 무디 목사를 세미나리에서 가르쳤던 교수의 손자였다), 비록 세들어 살긴 하지만 사택도 정말 좋았다. 집 앞과 뒤에 있는 삼육대학교 운동장 두 배 크기의 호수에는 철마다 새들이 바뀌어 날아들었다. 두 개의 테니스 코트와 수영장, 두 개의 농구 코트가 있는 사택의 환경도 환경이었지만 어떻게 교인들을 두고 떠날 수 있단 말인가? 매부가 포드에서 만든 차 중에서 가장 좋은 승용차인 5,000cc의 8기통짜리 크라운 빅토리아를 선물했을 때는 미국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영원히 사라질 것 같았었다. 고맙게도 아침 예배 시간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발표했을 때, 벌써 성령께서 역사하셨음인지 모두들 좋아 했다. 결정은 옳았다.
"목사님, 항상 예언의 성취가 얼마 안 남았다고 설교하시더니 미국에는 왜 가셔야 합니까?" 한국을 떠날 때 연약한 목자를 아끼던 교인들이 붙잡으며 하던 말이다. 굳이 이유를 대자면 모든 것이 앞선 나라를 찾아가 앞서 가는 전도 방법과 교회 성장의 비결을 배우고 싶었다. 4년 가까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배운 것은 학교에서가 아니었다. 담임하고 있는 교회와 학교를 오가며 목격한 미국 교회의 현장과 사회를 통해서였다. 1966년 이후 미국의 교회는 실제로 수많은 신자를 잃었다. 교회가 약화되기는 일반 개신 교회나 안식일 교회나 마찬가지였다. 합회들과 교회들은 서로 통합하여 줄어들고 목회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었다.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신학 외에 부전공을 갖도록 요구받는다. 목회로 부르심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다른 길을 위해 준비하기 하기 위한 배려이다. 이런 상황의 목격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에 성장하고 있는 교단이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은 십년 후의 한국 교회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이었다. 그 방법을 선교사 운동에서 찾은 것이다.
1997년 노원선교교회에서
글 수 96
새벽 두 시의 전화벨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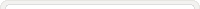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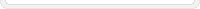










바른 선택에는 목사님과 가족들 모두가 망설임이 없으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