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외할머님은 같은 동네에 사셨지요.
그분이 제게 끼친 영향력은 컸지요.
외할머님과의 추억의 글 한편 올려 봅니다.
< 외할머님의 무덤가에 핀 싸리꽃 >
뻐꾹새가 구슬피 울던 늦은 봄날에 따사롭던 손과 자애롭던 눈길의
외할머님은 영영 오시지 못할 곳으로 떠나시고야 말았다.
긴긴 세월을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일관하시던 당신께서는
이제 말없이 여기 이 차가운 땅에 누워 계신 것이다.
처음에는 자주와서 외할머님께 얘기를 들려 드리고
무덤앞에 꽃도 심으리라고 작정했던 마음이
요즈음은 차츰 엷어져 죄스러움을 금할 길 없다.
오랫만에 찾아왔더니 이젠 제법 무덤위의 잔디가 자리를 잡아가고
무덤 주변도 터가 잡혀져 있었다.
잡초를 골라내고 돌들을 치워 무덤 주위를 청소한 후에
무덤옆 잔디위에 누워 잠시 떠가는 구름을 쳐다보고 있었다.
하늘을 바라보며 팔베개를 하고 모로 돌아 누우려다가,
무덤 너머 저만치에 대여섯대 가량의 싸리나무가
있는 듯 없는 듯한 꽃을 피운 채 가만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걸 보게 되었다.
산을 좋아하고 또 그 산에 핀 꽃중에서 싸리꽃의 순박한 자태를
가장 좋아하는 터인지라 한참을 바라보고 있던 나는 어느새 십수년 전
외할머님을 졸라 이모님 댁으로 가는 열두엇 먹은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다.
그날도 싸리꽃이 자줏빛으로 수수하게 피어 있었다.
버스에 내려서도 이십여리를 더 걸어간 곳에 있는 이모님댁은
외진 산 마을로 십여호 남짓한 산동네인데 참으로 인심좋고 경치가 좋은 곳이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길을 오르시는 외할머님은 힘이 드시는지
자주 걸음을 쉬고는 가쁜 숨을 쉬셨다.
"얘야, 저어기 저쪽에 있는 싸리꽃 한가지만 꺾어다오."
껑충껑충 산토끼처럼 외할머님을 빨리 따라 오라고 재촉하며
앞서 뛰어가던 나는 길위의 소나무 아래 피어 있는 싸리꽃 두어 가지를 꺾어 드렸는데,
그걸 비녀 머리에 꽂으신 당신께서는 다시 산길을 오르시면서
슬픈 곡조로 가사를 읊기 시작했다.
내용은 뭔지 알 수 없으나.
"후어이 후어이, 어이 어이-"
하는 후렴과 함께 들려오는 그 가사는 까닭모를
애달픈 심사를 불러 일으키게 하는 것이었다.
"저 논에 물은 저리도 잘 들어가는데 무섭이는 없구나!"
얼마전에 이모님댁 마을을 바로 밑까지 차올라 가는 저수지 공사에서
흙 싣는 트럭을 따라다니던 이종 사촌형인 무섭이 그만 트럭이 전복되면서
그 트럭에 치어 숨을 거두었는데,
공사가 끝나고 저수지에서 방류하는 물길을 따라 저수지에 갇혔던 물이
힘차게 수로를 지나 넓은 논으로 들어가는 걸 보시던 당신께서는
아마도 내가 아닌 또다른 외손자인 무섭이 형이 생각나신 모양으로
길게 장탄식을 하시는 것이었다.
구슬픈 가사 소리와,
외할머님의 두 눈에 배이는 더운 눈물과,
저수지 공사 덕에 밭이었던 곳이 논으로 변한 무심한 풍경과,
하모니커를 잘 불고 부지런하던 무섭이형 생각,
무섭 형을 잃고 물한모금 안 마시고 우시던 이모님의 처절한 모습 등이
한꺼번에 떠올라 나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해져서 걷다가,
외할머님이 혹여 내 눈물을 보시면 북받치는 슬픔에 목놓아 우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달음에 저수지 둑을 올라 갔었는데,
갑자기 깃털 고운 새 한 마리가 저수지의 푸른 물위를
"뿌릿- 뿌리릿-"
하며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순간,
어린 마음에 갑자기 그 새가 무섭 형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 새가 날아가는 곳을 한참 동안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았는데,
그 새는 저만치 날아가는가 싶더니 다시 내가 서있는 곳으로 날아와
크게 원을 그리며 빙빙 두어바퀴 도는 것이었다.
"무섭이 형! 저 아래 외할머니도 오셨는데..."
정말 그 새가 무섭이 형이라는 순간적인 착각에 빠져
나도 모르게 낮은 소리로 부르짖었다.
외할머님은 모퉁이 길을 돌아 오시는지 아직 보이지 않는데,
잠깐 사이 그만 그 새는 다시 날개를 움직여 길게
산속으로 날아가더니 영영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저수지 위로 한줄기 물바람이 불어 왔으며
바람이 부는 저수지 물이 끝닿은 곳에 이모님댁 초가가 거꾸로 떠 있었다.
둑위에 주저앉아 외할머님의 늦은 걸음을 안타까워 하던 나는
종내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잠시 후 뒤따라 오신 외할머님의 품에 안겨 더욱 소리를 내어 울었는데,
영문도 모르는 외할머님은 아무 말없이
그냥 따사로운 손길로 가만히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 것이었다.
그때의 외할머님의 두손은 정말 포근하고 뭐라 말할 수 없이 정이 담뿍 담긴 그런 손이었다.
그러던 외할머님은 이제 이 차가운 땅에서 말이 없으시다.
아니 끝없는 말을 들려주고 계신다.
"남에게 항상 공손하고 나쁜 행동은 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정직해야 하며 남의 것을 탐내면 못쓴다.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식구처럼 생각하고 항상 도와야 한다......"
어릴 때 외할머님댁에 가서 사랑방에 누워 자게 되는 날이면
호롱불 심지를 낮추신 외할머님은 잠자리 머리맡에 앉으셔서
늘상 부드러운 목소리로 잠이 들때까지 갖가지 교훈을 들려 주시곤 했었는데,
어쩐지 지금 그때의 외할머님의 목소리가 귀에 아련하게 들려오는 듯 느껴져
고개를 끄덕이다가 무덤가에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싸리꽃은 무심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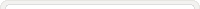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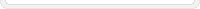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 할머니,
저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3년이 되던 해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할머니께서 드리신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찾고 싶은 분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의 산소를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공중에서 주님께서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시면 일어나시리라 믿었는데
주님께서 할머니의 무덤을 여시기 전에 할머니의 유택을 열어
유골을 수습할 때 송구스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면 우리 할머니와 안명찬 목사님의 할머니께서
손자들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