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수 1,322
<막장에서>
"덜커덩, 덜커덩...."
바깥은 살을 에이는 듯 춥건만 지하 갱도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열기가 느껴져 온다.
주욱 이어진 백열등이 어두운 갱안을 밝히고 있다.
폭좁은 레일위를 달리는 탄차에 탄 광부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검은 빛이다.
거기다 더하여 불안하고, 착잡한 표정.....
밝은 빛을 띤 갱입구는 금새 저만큼 멀어져 간다.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벌써 겁에 질려
몸이 움추려 들고 입에 거품을 물었을 것이다.
갱도안을 가로로 달리던 탄차에서 내려 수직으로
강하하는 괘지(엘리베이터 형태)로 갈아타면 실로 내동댕이치듯
순식간에 갱 맨밑바닥에 다다른다.
다시 괘지에서 내려 교대한 동료 광부들이 파던 막장으로 가로로 또한번 나아간다.
지하 1200미터.....
지구 중심, 펄펄 끓는 마그마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까마득 먼 거리인데도 마치 그 붉은 돌물이 옆에서
활활 타고 있는 듯 후끈후끈 몸이 달아 오른다.
석탄 가루를 들이마시면 폐속에 그 미세한 검은 입자가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 한번 들어오게 되면 허파속에 달라붙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 가루가 계속 달라붙게 되면 이른바 진폐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된다.
그 무서운 진폐를 예방하기 위해 얼굴에 쓴 분진방지용 마스크가
오늘따라 더 갑갑하게 느껴져 박씨는 훌렁 그걸 벗어 던졌다.
하긴 마스크를 써도 검은 탄덩어리를 향해 힘들여 곡갱이질을 하다보면
오히려 분진마스크 사이로 더 강하게 탄가루가 쫓아 들어옴을
잘 아는 광부들은 그걸 아예 쓰지 않을 때가 더 많다.
그칠줄 모르는 뜨거운 지열....
속옷만 남기고,
아니 아예 팬티만 걸치고 겉옷도 벗어 무용지물같은
분진방지마스크 위에 던져두었다.
그래도 땀이 흐른다. 쉴새없이......
몇십만년전, 땅덩이가 지진으로 요동치는 와중에
땅속으로 파묻혀 열을 낼 수 있는 덩어리로 변한
원래는 울창한 나무들이었던 검은 탄덩이들.....
돌처럼 딱딱하게 서로 엉겨붙은 탄들은 그냥 시커먼 색깔이지만
안전모위에 달린 전등이 비춰지면 자르르 윤기가 흐른다.
때로 탄덩이들 여기저기에 동그랗게 결정을 이룬 모양이 눈에 뜨이는데
그 모양은 흡사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속에
갇힌 마왕의 외눈같은 느낌이 든다.
곡괭이를 쥐고 다가가자 외눈부분을 위시한
검은덩어리 몇개가 쭈르르 발앞으로 떨어져 온다.
섬찟한 느낌...... 아무도 없다.
나갈 수 없는 지하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다.
순간,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입술을 깨문다. 불끈 곡괭이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너무 늦게 꺼내주어 화가 난 마왕이 꺼내준 신밧드를
오히려 해치려고 대어든다는 대목이 이야기 책속에 나오는데,
시커먼 석탄덩이들은 때로 심술을 부려 자신의 몸을 흠집내는
광부들을 해하려고(매몰시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아들만 넷을 둔 박씨...
가난에 찌들은 농촌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려고 안해 본 일이 없건만
하는 일마다 꼬이기만 하였다.
결국 흘러흘러 태백산맥 한가운데 있는 이 광산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일이 힘든것도, 나중에 걸릴 진폐증도 다 괜찮은데,
아이들을 다키우기 전인 지금 당장 사고가 나서
죽는 것만은 견딜수 없는 두려움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일을 하던 동료들이 가끔씩
막장 탄덩이에 묻혀 아까운 목숨을 어이없이 잃어버리는 것을 볼라치면
박씨는 금방이라도 탄광촌을 박차고 나가고만 싶었다.
가장을 잃은 가족들의 통곡이 앞뒷산 가득한 검은 탄덩이들 위로
길게길게 퍼져 나가는 날이면 박씨는 밤새도록 잠을 못이루고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불안에 떨었다.
그래도 어김없이 날은 밝아오고......
분진마스크를 벗어던진 채 막장에서 곡괭이질을 하는
박씨의 콧속으로 흉칙한 죽음의 검은가루들은 오늘도 좋아라 쫓아 들어가
끈적하고 따스한 허파속에 찰싹 달라붙었다.
연이어그 검은가루들은 서로 절대 허파 바깥으로 나가면
안된다는 굳은 약속들을 하였다.
그리고 미처 콧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검은 가루들은 팬티만 입은,
그 팬티마저 벗어 땀을 쥐어짜며 처자식을 위해 목숨을 건 채 허겁지겁 일을 하는,
박씨의 온몸으로 날아가 박씨를 숯덩이처럼 검게 만들고 있었다.
매번 막장에서 나와 갱입구의 밝은 빛을 보게될 때마다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긴장이 풀린 두다리가 허공을 딛는 것처럼 느껴진다.
광부들은 탄광전용 목욕탕에서 앗뜨거 앗뜨거하면서 검은 가루를 죽어라 씻어 낸다.
물이 어지간히 뜨겁지 않으면 탄가루가 씻겨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탄광촌의 목욕탕 물은 어딜가나 살을 데일만큼 뜨겁다.
뜨거운 물을 가슴속으로 들이 부어 폐속에 따갑게 자리잡은
탄가루도 씻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문득 문득 간절해온다.
날이 어둡고 다시 밝아오고....
박씨를 비롯, 김씨,이씨,최씨....
다들 또다시 외눈박이 마왕같은 검은 탄덩이와 마그마가
옆에서 끓는 듯 더운 막장으로 향한다.
그러한 광부들의 희생을 밑바탕으로 광산촌은 한때 활기에 넘쳤다.
보수 지급날이면 광산촌의 강아지는 만원권을 물고 검은 물이 흐르는
강언덕을 철버덕 철버덕 뛰어 다녔다.
오랫동안 막장에서 탄을 캐던 박씨는 용케도 막장에 갇히지 않고 살아 남았다.
그러나 매일매일 몸속으로 들어간 탄가루는 늙어가는 박씨가 숨을
쉴때마다 죽는 게 더 나을것 같은,
그야말로 가슴을 찢는 듯한 견디지 못할 고통을 안겨주었다.
연료가 기름이나 가스, 전기로 대체된 요즈음...
몇몇 광산을 빼고는 모조리 폐광이 되어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다들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결국 박씨처럼 오갈데 없는 진폐환자들만 진폐전문 요양병원에,
그도 아니면 쇠락해가는 어설픈 광부전용 사택에서 병원을 오가며
고통스런 여생을 보내고 있다.
물론 따가운 가슴을 움켜쥐고 몸부림치다가
막장에서 세상을 마감한 동료들을 뒤따라간 광부들도 있었다.
처절한 삶을 산 광부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그러다 쓸쓸하고 흔적없이,
연탄재처럼 숨이 져도,
세상은..... 그냥 잘 돌아가고 있다.

"덜커덩, 덜커덩...."
바깥은 살을 에이는 듯 춥건만 지하 갱도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열기가 느껴져 온다.
주욱 이어진 백열등이 어두운 갱안을 밝히고 있다.
폭좁은 레일위를 달리는 탄차에 탄 광부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검은 빛이다.
거기다 더하여 불안하고, 착잡한 표정.....
밝은 빛을 띤 갱입구는 금새 저만큼 멀어져 간다.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벌써 겁에 질려
몸이 움추려 들고 입에 거품을 물었을 것이다.
갱도안을 가로로 달리던 탄차에서 내려 수직으로
강하하는 괘지(엘리베이터 형태)로 갈아타면 실로 내동댕이치듯
순식간에 갱 맨밑바닥에 다다른다.
다시 괘지에서 내려 교대한 동료 광부들이 파던 막장으로 가로로 또한번 나아간다.
지하 1200미터.....
지구 중심, 펄펄 끓는 마그마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까마득 먼 거리인데도 마치 그 붉은 돌물이 옆에서
활활 타고 있는 듯 후끈후끈 몸이 달아 오른다.
석탄 가루를 들이마시면 폐속에 그 미세한 검은 입자가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 한번 들어오게 되면 허파속에 달라붙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 가루가 계속 달라붙게 되면 이른바 진폐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된다.
그 무서운 진폐를 예방하기 위해 얼굴에 쓴 분진방지용 마스크가
오늘따라 더 갑갑하게 느껴져 박씨는 훌렁 그걸 벗어 던졌다.
하긴 마스크를 써도 검은 탄덩어리를 향해 힘들여 곡갱이질을 하다보면
오히려 분진마스크 사이로 더 강하게 탄가루가 쫓아 들어옴을
잘 아는 광부들은 그걸 아예 쓰지 않을 때가 더 많다.
그칠줄 모르는 뜨거운 지열....
속옷만 남기고,
아니 아예 팬티만 걸치고 겉옷도 벗어 무용지물같은
분진방지마스크 위에 던져두었다.
그래도 땀이 흐른다. 쉴새없이......
몇십만년전, 땅덩이가 지진으로 요동치는 와중에
땅속으로 파묻혀 열을 낼 수 있는 덩어리로 변한
원래는 울창한 나무들이었던 검은 탄덩이들.....
돌처럼 딱딱하게 서로 엉겨붙은 탄들은 그냥 시커먼 색깔이지만
안전모위에 달린 전등이 비춰지면 자르르 윤기가 흐른다.
때로 탄덩이들 여기저기에 동그랗게 결정을 이룬 모양이 눈에 뜨이는데
그 모양은 흡사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속에
갇힌 마왕의 외눈같은 느낌이 든다.
곡괭이를 쥐고 다가가자 외눈부분을 위시한
검은덩어리 몇개가 쭈르르 발앞으로 떨어져 온다.
섬찟한 느낌...... 아무도 없다.
나갈 수 없는 지하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다.
순간,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입술을 깨문다. 불끈 곡괭이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너무 늦게 꺼내주어 화가 난 마왕이 꺼내준 신밧드를
오히려 해치려고 대어든다는 대목이 이야기 책속에 나오는데,
시커먼 석탄덩이들은 때로 심술을 부려 자신의 몸을 흠집내는
광부들을 해하려고(매몰시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아들만 넷을 둔 박씨...
가난에 찌들은 농촌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려고 안해 본 일이 없건만
하는 일마다 꼬이기만 하였다.
결국 흘러흘러 태백산맥 한가운데 있는 이 광산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일이 힘든것도, 나중에 걸릴 진폐증도 다 괜찮은데,
아이들을 다키우기 전인 지금 당장 사고가 나서
죽는 것만은 견딜수 없는 두려움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일을 하던 동료들이 가끔씩
막장 탄덩이에 묻혀 아까운 목숨을 어이없이 잃어버리는 것을 볼라치면
박씨는 금방이라도 탄광촌을 박차고 나가고만 싶었다.
가장을 잃은 가족들의 통곡이 앞뒷산 가득한 검은 탄덩이들 위로
길게길게 퍼져 나가는 날이면 박씨는 밤새도록 잠을 못이루고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불안에 떨었다.
그래도 어김없이 날은 밝아오고......
분진마스크를 벗어던진 채 막장에서 곡괭이질을 하는
박씨의 콧속으로 흉칙한 죽음의 검은가루들은 오늘도 좋아라 쫓아 들어가
끈적하고 따스한 허파속에 찰싹 달라붙었다.
연이어그 검은가루들은 서로 절대 허파 바깥으로 나가면
안된다는 굳은 약속들을 하였다.
그리고 미처 콧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검은 가루들은 팬티만 입은,
그 팬티마저 벗어 땀을 쥐어짜며 처자식을 위해 목숨을 건 채 허겁지겁 일을 하는,
박씨의 온몸으로 날아가 박씨를 숯덩이처럼 검게 만들고 있었다.
매번 막장에서 나와 갱입구의 밝은 빛을 보게될 때마다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긴장이 풀린 두다리가 허공을 딛는 것처럼 느껴진다.
광부들은 탄광전용 목욕탕에서 앗뜨거 앗뜨거하면서 검은 가루를 죽어라 씻어 낸다.
물이 어지간히 뜨겁지 않으면 탄가루가 씻겨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탄광촌의 목욕탕 물은 어딜가나 살을 데일만큼 뜨겁다.
뜨거운 물을 가슴속으로 들이 부어 폐속에 따갑게 자리잡은
탄가루도 씻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문득 문득 간절해온다.
날이 어둡고 다시 밝아오고....
박씨를 비롯, 김씨,이씨,최씨....
다들 또다시 외눈박이 마왕같은 검은 탄덩이와 마그마가
옆에서 끓는 듯 더운 막장으로 향한다.
그러한 광부들의 희생을 밑바탕으로 광산촌은 한때 활기에 넘쳤다.
보수 지급날이면 광산촌의 강아지는 만원권을 물고 검은 물이 흐르는
강언덕을 철버덕 철버덕 뛰어 다녔다.
오랫동안 막장에서 탄을 캐던 박씨는 용케도 막장에 갇히지 않고 살아 남았다.
그러나 매일매일 몸속으로 들어간 탄가루는 늙어가는 박씨가 숨을
쉴때마다 죽는 게 더 나을것 같은,
그야말로 가슴을 찢는 듯한 견디지 못할 고통을 안겨주었다.
연료가 기름이나 가스, 전기로 대체된 요즈음...
몇몇 광산을 빼고는 모조리 폐광이 되어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다들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결국 박씨처럼 오갈데 없는 진폐환자들만 진폐전문 요양병원에,
그도 아니면 쇠락해가는 어설픈 광부전용 사택에서 병원을 오가며
고통스런 여생을 보내고 있다.
물론 따가운 가슴을 움켜쥐고 몸부림치다가
막장에서 세상을 마감한 동료들을 뒤따라간 광부들도 있었다.
처절한 삶을 산 광부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그러다 쓸쓸하고 흔적없이,
연탄재처럼 숨이 져도,
세상은..... 그냥 잘 돌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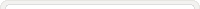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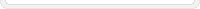










따뜻한 아랫목에 발을 묻고 있다가 이불을 떨치고
연탄불을 갈러 잠깐 나가는 것도 추워서 서로 미루는 호강도
사실은 박씨같은 분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