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사변이 나니 코앞이 38선이라 인민군들이 금새 들이 밀었다가,
국군들이 다시 올라왔다가,
또다시 셀 수도 없는 까만 중공군들이 왔다가,
미국의 그 뭐라더라 아 그래 맥아더 장군이 인천 앞바다로,
서울로 와서 그렇게 전쟁은 끝났는데...
먹을 거리가 없었어...
폭격통에 무너진 집을 지금은 죽고 없는
우리 영감(시어머니가 등을 밀어 남으로 피난 갔다가 용케도 살아 돌아온)과
둘이서 나무를 잘라오고 찰흙을 개고 해서 대강대강 수리를 하고나서,
이산 저산 나물을 하러 분주하게 쫓아 다녔지.
그때야 젊었으니 산을 훨훨 새처럼 날아 다녔어.
눈도 밝았으니 먹을 만한 나물은 어느 것이라도 한잎 안 놓치고 다 뜯었지.
나물 캐는 한편으로 툭툭 송홧가루도 채반에 담아 오고, 찔레순도 꺾고, 더덕도 캤어.
더덕이야 산등성이에 올라서면 벌써 냄새가 진동을 하니
부리나케 달려가서 담쑥 담쑥 잘도 캤지.
헌데 더덕은 냄새도 향기롭지만 그걸 잔뿌리 하나 안다치고 잘 캐서
허리에 둘러맨 광주리에 넣을 때면 왜 그리 흐뭇한지 입이 절로 벌어졌었어.
어쨌든 그렇게 갖가지 나물을 해서 고픈 배를 채워가며 이날까지 살아 온 거야.
앞산 뒷산 산나물이 우리를 살린 거지..
산나물을 곡식알갱이 보다 더 많이 섞어서 매일같이 먹다가 어떤 때는 별미를 먹기도 했어.
뭐냐하면 미군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가져온 밀가루를 사람들에게 배급하던 때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그 밀가루를 부끄럼도 모르고 받아와서 수제비를 만들었던 때가 생각나.
물론 밀가루 반죽보다 산에서 캐온 시퍼런 나물들이 더 많이 들어갔지.
펄펄 끓던 산나물 수제비국이 배고픈 아이들의 급한 입으로 들어가면서
아이들의 입천장을 훌렁훌렁 뒤집어 놓았어.
그렇게 키운 애들이 여덟... 아들 넷 딸넷...
후유 - 그러나 다들 가버렸어.
아들들이 가끔씩 내게 와서 도시에 있는 저희들 집으로 가자고 해.
글쎄 다 늙은 에미가 뭐 그리 대수라고....
마지못해 일년에 한두번씩 오라고 성화를 대는 아이들 집에 가보면
다들 제 자식들 키우느라 바빠.
그리고 도무지 닭장같은 아파트에는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어 아이들 집에서
사흘을 못 넘기고 다시 여기 이집으로 돌아오고야 말지.
내가 아이들 아이들 하지만 큰 아들 둘째 아들은 벌써 손자를 봤어...
그야말로 같이 늙어가...
이제 내 나이 팔십하고도 넷이야. 꿈같이 흘러 가버렸어.
세월들이....
귀 어둡고 눈 어둡고, 어두운 눈에 쉴 새 없이 눈곱이 끼고...
몹쓸 관절염까지 도져서 지난 겨울밤에 뒷간 갔다가
오금이 붙어 움직일 수가 없어 얼어 죽을 뻔 한 적도 서너번이나 돼...
그렇게 쓸쓸하고 괴롭던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
이제는 젊었을 때처럼 산에 나물을 하러 갈 수 없어 가끔씩 젊은 사람들이
나물하러 가는 것을 부러워만 하며 봄을 보냈지.
몇해 그러다가 작년 늦여름에 간신히 얕은 산에 올라가서
날아가려는 나물씨를 받아다가 집 둘레에다가 하나하나 정성스레 모종을 했어.
그랬더니 집주위가 왼통 나물천지가 됐어.
매년 서울에서 나물 장수가 오는데,
우리집 나물을 보더니 탐이 나는지 뜯어서 팔라고 하길래 처음에는 안판다고 했지.
나물 뜯어 말려 놨다가 아이들 다니러 오면 주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럼 쑥이라도 캐서 주세요 하길래 한근에 얼마냐고 우선 물었더니 800원이라고 하더만.
그래 햇쑥을 시름없이 캤어.
해가 기울도록 캐서 머리에 이고 아픈 다리를 이끌고
비탈길을 내려가 나물 장수에게 건넸더니,
글쎄 낮동안에 금새 나물값이 100원 내려 700원이 되었다나.
할 수 없지 뭐 그렇게라도 나물값을 받아왔지.
이튿날이 되었어.
나물 장수가 또 와서는 기어이 여기저기 집둘레에 돋아난 나물을 팔라고 하는 거야.
나물 값을 물었더니 한근에 1,500원이라고 했어.
윤이 반짝 반짝 나고 살이 붙은 나물들을 여린 순만 조심조심 캐서
정하게 다듬은 다음 대강 근을 지워 비탈길을 다시 내려 갔지.
근을 지우긴 했지만,
글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눈이 어두워 몇근이 나가는지도 몰라.
옛날에 장사꾼들이 많이 들고 다니던 근량이 넘치면
추가 막 하늘로 치솟곤 하던 막대 저울은 그래도 눈금을 좀 볼 줄 아는데,
아 그 저울들은 어디로들 자취를 감췄는지..
근수를 대중할 수 없어 영 맘에 안드는 둥그런 저울 위에
간신히 해온 나물을 올려 놓았는데,
깍쟁이 같은 젊은 나물 장수여자가 글쎄 어제와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거야.
오늘 오후에 나물시세가 갑자기 내렸다면서 나물 한근에 1,500원이 아니라
어제 쑥값과 똑같은 700원이라고 하면서 봉고차에 있는 프라스틱 바구니에
내가 캐간 나물을 재빨리 움쑥 쏟으려는 거야.
나는 대뜸 안판다고 소리를 냅다 질렀어.
어제 쑥을 이고 내려갔던 탓에 머리꼭지가 아파서
옆집에서 빌린 외바퀴 수레에 나물을 싣고 집아래로 어렵게 내려갔는데,
내 모양새를 보고 다시 가지고 올라갈 수 없으려니 하고
나물장수 여자가 나를 물먹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야.
그럼 맘대로 해요라는 표정으로 버릇없이 쳐다보는 젊은 여자를 뒤로하고
나물을 다시 외바퀴 수레에 싣고 비탈길을 올라오려니,
젊은 여자 보기 창피하게 걸음이 자꾸 뒤뚱거리고
수레는 자꾸만 쏟아지려하고 머리는 어지럽고 가슴은 뛰고...
꼭 강건너 사는 여주댁 모양 풍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결국 나물장수가 안보이는 탱자나무 울타리까지 왔는데
그만 발이 삐끗하여 넘어지면서 옆에 있는 개물물 속으로
금쪽같이 자르르 윤기나는 나물들이 죄 쏟아져 버렸어.
망연자실...
그러고 집까지 오려는데 너무나 가슴이 찡하니 아파왔어...
기어이 어이어이 하고 울었어.
늙은게 서럽고,
늙었는데 죽지 않았음이 서럽고,
자식들이 곁에 없음이 서럽고...
늙은이 공경할 줄 모르는 이 시절이 원망스러웠어.
우리가 젊을 때에는 어른들 앞에서는 기침도 제대로 안했어.
나물장수가 처음 내게 말한대로 나물값을 제대로 쳐 줬으면
삼천몇백원하는 전기세를 몇 달 잊어도 될 만큼 내게는 큰 돈이었는데...
벌써 한여름인데...
지금도 지난 봄, 윤나고 살찌고 깨끗하게 다듬어 먹기좋았던
그 봄나물 덩어리가 개울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이 이 침침한 눈에 어른거려.
어쩌면 그 나물장수여자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를 속였던 것 같은데,
그냥 100원을 받더라도 아무소리 말고 넘겨줄 걸 그랬나봐.
아니면 개울물이 급하지 않게 내려가니 힘들더라도
뒤따라가서 건져서 삶아 놨다가 애들을 줄걸.....
어쨌든 그 봄나물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 늙은 가슴이 너무 저려와.....
- 자고 일어나면 앞산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게 보인다는,
인생의 불이 거의 꺼져가는 순박한 할머니가 받고 싶었던 봄나물 값은
한근에 1,500원하는 열근 값,
단돈 만오천원이었습니다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막골 사시는 어느 할머님 이야기)
마을 사람들이 우체국에 와서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하더군요.
막골 사는 할머니인데 관절염이 심해서 겨울 한밤중에 마당끝에 있는 뒷간을 갔다가
오금이 떨어지지 않아서 얼어죽을 뻔 했다고....
그 할머님댁을 물어서 갔는데 할머님이 의외로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셨지요.
혹시나 오금 붙어서 얼어 돌아가실까봐 저녁 먹고 나면 간식거리를 싸들고
우체국에서 한 오리쯤 떨어져 있는 할머님댁을 자주 자주 찾아갔지요.
할머님은 군불을 뜨끈뜨끈하게 때어놓고 제가 가면 아주 반가워 하셨지요.
귀가 어두우신 할머님은 그래도 이야기 보따리만은 구수하게 잘 풀어 놓으십니다.
몇마디 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겪지 않아도 훤히 짐작이 가곤 했습니다.
(기와집을 짓는다치면 할머님이 두어삽 퍼고 물러섰는데, 저는 할머님의 두어삽에 이어
주춧돌 다져 앉혀놓고, 기둥 세우고, 서까래 올리고, 찰흙 이겨 지붕기초하고 대문까지
얼른 단다고 할까요? ^^)
가만있자...그러고 보니 할머니 위로 방문 한답시고 가서
이야기 소재만 얻어 온 형국이군요.
그렇게 얻어 온 글감으로 여기 저기 투고하여 원고료 많이 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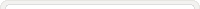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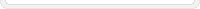











이렇게 아름다운 글감을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추천 안 할 수 없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