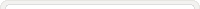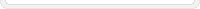3월 27일 화
아침 열시쯤 되어 영국박물관으로 출발했다. 사람들은 대영박물관이라고 말하지만 공식 명칭이 British Museum이니 영국박물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것같다. 런던을 소개하는 책자에는 다 보려면 며칠 걸린다고 했지만 얼마나 자세히 보기에 며칠씩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다. 특별히 이집트 관련 전시실과 그리스의 파르테논을 뜯어다 놓은 곳에서는 시간이 걸릴 만도 했다. 이집트, 그리스 등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유물들이 제 나라 유물처럼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영국박물관이면 영국에 대해서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영국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온통 다른 나라 유물들로만 채워져 있는 듯했다. 아직도 식민지 시대인가 아니면 제국주의 시대인가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로제타 스톤과 고레스의 원통형 비석을 본 것은 나름대로 큰 수확이었다.
영국박물관에 들어섰을 때 영국도서관이 있던 자리에 지은 둥근 돔 형태의 그레이트 코트와 유럽에서 가장 높은 그리고 큰 유리 천장이 인상적이었다. 아무래도 온실효과로 여름에는 더울 것 같아 직원을 붙들고 어떻게 열처리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염려했던대로의 대답을 한다. 여름에는 온실 그 자체란다. 그리고 박물관 관람실도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 여름에 냉방이 안되는 곳이 전체의 75% 이상이라며 년중 가장 좋은 시절에 왔다고 한다.
런던에서 특히 어제 오늘 다닌 곳에는 어쩌면 영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듯 했다. 사람을 붙들고 말을 걸어보면 영어를 전혀 하지 않는 관광객이 너무나 많았다.
거리에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해질 무렵 조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방을 메고 뛰었다. 출퇴근 길을 운동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16380보를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