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수 1,323

<작가의 고향에서>
주위에서 다들 말렸다.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아이들 교육을 생각한다면
시골로 가서는 안된다고...
아이들 교육이라고?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아직은 풋풋한 흙내음 감도는 곳,
아직은 시냇물이 유리알처럼 맑게 흘러가고 있는 곳,
아직은 더러 흙담집이 남아 있어서 구수한 저녁연기가
땅거미지는 마을을 휘돌아 올라가는 곳,
그리고 봄되면 진달래 가득한 온 산을 뛰어 다니는
조무래기들과 이골저골 나물캐는 순박한 아낙들이 있고,
여름에는 풀먹는 소들의 울음소리와,
가을이면 메뚜기가 온 들판 가득 뛰놀고 있는 곳,
겨울이면 집집마다 정겨운 이야기가 도란도란 들려 오고,
낮에는 푸른하늘과 흰구름,
밤에는 은하수 가득한 하늘에 또렷하고
초롱초롱한 별과 둥두렷한 밝은 달을 볼 수 있는 곳... .
그런 곳이야 말로 내 아이들 정서의 밑바탕이
흙냄새와 새소리와 푸른 솔바람 소리와 훈훈한 시골 인심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던 차,
마침 여건이 주어지자 주저없이 脫都市를 결행하였다.
이제 더 자라면 도시로 가자고 조르게 될 아이들이지만
지금은 이 애비가 하는대로 그냥 따라올 수 밖에 없는 나이일 때,
그야말로 더 늦기전에 단 몇년만이라도 그런 곳으로
가야한다는 조바심속에 살고 있던 터였다.
평창!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 효석님의 고향...
참으로 운 좋게도 작가의 고향 땅으로 가도록 결정된 날 밤은
온통 가슴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잠을 설쳤다.
눈을 잔뜩 이고 있는 높은 산굽이를 몇굽이나 돌고,
은회색으로 군데군데 얼어있는 강줄기를 지나 늦은 저녁 무렵
평창땅에 들어섰을 때에는 까닭모를 흥분으로 시장함도 잊고
평창 읍내를 한바퀴 돌아 보았다.
높고 낮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기대했던 평창의 강물은 먼길 달려온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듯
맑고 아름다운 자태로 겨울밤을 고요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구수한 말씨와 따사로운 인심을 지닌 평창 사람들...
아직도 평창에는 5일장이 대여섯군데(평창, 대화, 봉평, 미탄, 진부, 계촌)
날을 달리하여 선다고 하였다.
이효석님이 보았던 허생원이나 조선달,
그리고 허생원의 한점 혈육임에 틀림없을 것으로 암시되었던
동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듯한 순박함이 아직 남아있는
장사꾼들 틈에 끼어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장터를 쏘다녔다.
산촌이라 주로 나물이나 버섯, 약초 등속을 내다 팔러온
사람들의 얼굴 모양은 평창의 풍광 좋은 산수를 닮아 무척 순박해 보였다.
파장이 되어 다음 장터로 가는 장사꾼들이 나귀(허생원들의)대신
트럭에 짐을 죄다 싣고 떠나는 것이 조금은 아쉬웠지만, 세월의 변화임에랴....
봉평!
풍경은 낯설지만 수차례 『메밀꽃 필 무렵』을 읽었던 터라
봉평이란 지명이 끝없는 정겨움으로 느껴져 왔다.
봉평 초입에 메밀꽃길 7km가 조성되어 있다는 안내 팻말이 서 있었는데,
일부러 가꾸지 않아도 지역의 농민들이 스스로 가꾸는 자연스런
메밀밭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일었다.
아직 겨울이라 ‘소금을 뿌려 놓은 듯 흐드러지게 핀 메밀꽃’을 볼 수는 없었지만,
작년 늦여름에 수확해 두었던 메밀로 만든 메밀묵의 담백한 맛으로
여름에 필 메밀꽃을 그리며 성급한 마음을 달래었다.
옛날과 달리 정오가 되기 전에 벌써 파장이 되어버린
봉평장터에 서서 동이와 허생원 같이 떠돌이 장돌뱅이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충주댁의 앙칼진 목소리와,
묶어둔 나귀를 성가시게 구는 깍다귀들의 장난스런 웃음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듯하여 한참을 귀기울이며 묵묵히 서 있었으나,
종내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고 겨울 눈바람 소리만 먼 산으로부터 고즈넉히 들려왔다.
대화나 진부장터로 가는 길은 포장이 잘되어 자동차들이 거침없이 달리고 있었으나,
외줄로 늘어서지 않으면 안되는 산 비탈길과,
허리까지 차오는 시린 강물은 아직 쉽사리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다지 변하지 않은 산야가 바로 앞뒤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 듯
손에 잡힐 듯하여 왠지 가슴이 넉넉하여져 왔다.
소설은 거의 허구이지만 허구가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이효석님이 썼다면
『메밀꽃 필 무렵』에 나왔던 조선달은 한두해 더 벌어 모아
전방을 차려 정착하였을 것이고,
허생원과 십수년만에 상봉한 동이의 어머니, 동이 또한 봉평 처녀에게
장가들어 아마도 지금쯤은 손자나 증손을 보았을 것 같다.
그 동이의 후예와 우리 아이들이 후덕한 평창땅을
닮은 모습으로 뒤섞여 자란다? 생각만 하여도 마음이 흐뭇하여
누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없는 웃음
(‘왜 사냐건 웃지요’라는 말의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은)을 웃곤 하였다.
어서 여름이 오면 멀리 사는 도회지의 지인들을 불러 모아
맑은 강가 소금을 뿌려 놓은 듯 흐드러지게 꽃이 핀
메밀 밭머리에 서 있게 해야겠다. 그것도 보름달이 환하게 뜬 한밤에...
- 4년여를 살았던 강원도의 한가운데인 평창은 어디를 가나 산수화 그 자체였다.
그곳에서 알게된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구수하였다.
지금도 그 정겨운 산야와 평창에서 정이 든 분들을 생각하면
왠지 소중한 그 무엇을 잃어 버리고 사는 것 같은 생각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
2009.01.14 09:18:36 (*.163.188.77)
조해준 목사님....
지난번 목사님의 동영상을 보고 경건하고 온유한 분이라는 걸 단번에 알게 되었었지요.
부족한 글에서 따뜻한 그림을 떠올리셨다니....감사합니다.
공허한 홍콩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주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메밀에 얽힌 짧은 이야기 한편 추가 합니다. ^^
지난번 목사님의 동영상을 보고 경건하고 온유한 분이라는 걸 단번에 알게 되었었지요.
부족한 글에서 따뜻한 그림을 떠올리셨다니....감사합니다.
공허한 홍콩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주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메밀에 얽힌 짧은 이야기 한편 추가 합니다. ^^
평창은 정말 좋은 곳이지요. 늘 그곳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답니다.
메밀에 얽힌 이야기 한편...
큰 외숙모님이 메밀 방아를 찧는 날이었어요.
메밀 낟알은 껍질은 검고 안은 희지요.
방아확에다 메밀을 수북 넣고 왈가랑 달강 방아다리를 들었다 놓았다하면
확에서는 푹석푹석 소리가 나면서 메밀이 부서지지요.
옆에서 방아찧는 걸 구경하는 저를 보고 외숙모님이 방아다리 한쪽에
올라서서 같이 찧자고 하였지요.
세번정도는 괜찮지만 어린 시절이라 대여섯번을 넘어가면 다리가 아파오지요.
그야말로 슬슬 꾀가 나지요.
그런데 외숙모님은 그러는 저를 보고,
"아이고 얘는 나이도 어린데 어른들보다 방아다리를 더 잘 맞추네..!!"
방아다리는 두개인데 방아다리를 누르는 두사람의 호흡이 잘 맞아야
방앗공이가 제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요. 힘도 덜 들고요.
그만하려는 저를 보고 외숙모님은 구슬리는 말씀을 간간히 하면서
종내 메밀이 다 빻아질 때까지 저를 방아다리 위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셨지요.
그렇게 저를 부려 먹은게 미안하셨던지 같은 마을에 사시던 외숙모님은 그날 밤에 메밀 묵을
양푼가득 쑤어서 들고 오셨지요.
외갓댁에 저녁 마실을 가면 가마솥에 제몫의 고구마나 밤, 감자 같은 걸 따로 따스하게
보관해 두었다가 주시던, 이제는 이 세상 분이 아니신 외숙모님이 많이 그립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답니다.
메밀에 얽힌 이야기 한편...
큰 외숙모님이 메밀 방아를 찧는 날이었어요.
메밀 낟알은 껍질은 검고 안은 희지요.
방아확에다 메밀을 수북 넣고 왈가랑 달강 방아다리를 들었다 놓았다하면
확에서는 푹석푹석 소리가 나면서 메밀이 부서지지요.
옆에서 방아찧는 걸 구경하는 저를 보고 외숙모님이 방아다리 한쪽에
올라서서 같이 찧자고 하였지요.
세번정도는 괜찮지만 어린 시절이라 대여섯번을 넘어가면 다리가 아파오지요.
그야말로 슬슬 꾀가 나지요.
그런데 외숙모님은 그러는 저를 보고,
"아이고 얘는 나이도 어린데 어른들보다 방아다리를 더 잘 맞추네..!!"
방아다리는 두개인데 방아다리를 누르는 두사람의 호흡이 잘 맞아야
방앗공이가 제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요. 힘도 덜 들고요.
그만하려는 저를 보고 외숙모님은 구슬리는 말씀을 간간히 하면서
종내 메밀이 다 빻아질 때까지 저를 방아다리 위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셨지요.
그렇게 저를 부려 먹은게 미안하셨던지 같은 마을에 사시던 외숙모님은 그날 밤에 메밀 묵을
양푼가득 쑤어서 들고 오셨지요.
외갓댁에 저녁 마실을 가면 가마솥에 제몫의 고구마나 밤, 감자 같은 걸 따로 따스하게
보관해 두었다가 주시던, 이제는 이 세상 분이 아니신 외숙모님이 많이 그립습니다.
2009.01.14 11:20:25 (*.142.21.217)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지낼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도시에 남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시골에 있어야 지요..ㅎㅎ
요즘 아이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 지네요...
어느것이 좋은 길인지..
집사님의 글을 보면서 나름 마음의 생각이 정리가 되네요.
아이들을 위해서 도시에 남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시골에 있어야 지요..ㅎㅎ
요즘 아이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 지네요...
어느것이 좋은 길인지..
집사님의 글을 보면서 나름 마음의 생각이 정리가 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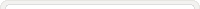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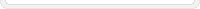











저 어렸을 때 미대지망생! 집사람은 안 믿었는데 요즈음 아이들 그림 그려주는 것 보고는 긴가 민가 하더군요. 고등학교때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부모님의 한 마디, "그림은 취미로 하는 것이 어때?" 그 말에 미대진학을 접었습니다. 갑자기 목표가 사라져 약간 방황했지만 그 방황이 저를 마침내 신학공부로 이끌었습니다. 그림은 그리면 그릴수록 잘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림은 따뜻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색깔들의 조합으로 평면에 그려진 것이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발산할 수 있는 온기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림... 그래서 살면서 그림 몇 점들을 샀지요. 한번은 고속도로 휴개소에 갔는데 화장실에 걸려있는 너무 따뜻한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휴개소 로비 비슷한 곳에서 똑같은 그림을 팔더군요. 그렇게 연결된 것이었지요. 그래서 샀습니다. 지금 홍콩의 저희 집에 그 그림이 걸려있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질 때 가끔씩 보는데 정말 신기하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발산하는 온기가 참된 따뜻함인데...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재림의 중요한 징조가 많이 있지만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가장 주목해야 할 징조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마24:12)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생명체가 더이상 따뜻함을 발산하지 못한다면 때가 다 된 것이겠지요.
글 정말 감사합니다. 읽으면서 머리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정말 따뜻한 그림입니다. 저도 그 그림속으로 들어가 볼 때가 오겠지요, 아이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