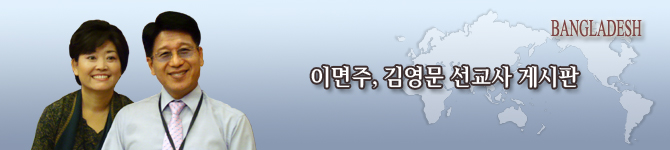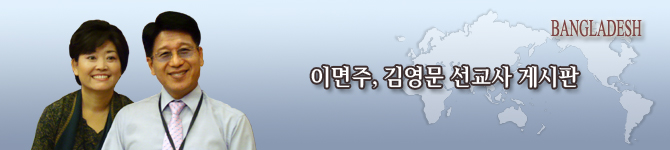|

|
|
 사진설명 사진설명
|
|
‘슬럼지역 여성을 위한 벵갈어교실’에 방글라데시 빈민지역 여성들이 모여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
|
사진기자 : 아드라 제공 | | |
|

|
|
|
철창이 높게 드리워진 문으로 들어가니, 판자로 얼기설기 엮은 집들이 늘어서 있다. 좁은 골목을 여러 개 지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자꾸만 들어가니 한 무리가 눈에 띈다. 12명가량의 여성들이 바닥에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 설명을 듣는다.
한, 두 사람이 지나기에 딱 알맞은 골목길. 간간히 불어대는 바람조차, 뜨겁기만 해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그러나 바닥에 앉아 글을 배우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은 진지하기만 하다. 아니, 불청객으로 인해 공부에 방해가 될까, 시선을 이곳으로 돌리기가 미안할 정도이다.
이 모임은 ‘슬럼지역 여성을 위한 벵갈어교실’이다. 아드라 방글라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빈곤여성을 위한 프로젝트로 다카 슬럼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건강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건강교육, 벵갈어 교육, 재봉기술, 영양실조자녀 건강식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25명의 여성이 한 그룹으로 편성되어 총 60그룹, 약 1,500명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진행하는 봉사자는 5명이 전부다. 때문에 직접서비스의 혜택이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 벵갈어 모임은 이 지역에서는 한 달에 두 번 진행하는 하지만, 봉사자들은 매일 다른 그룹을 돌아다니며 글을 가르치고 있다.
유난히 울어대며 보채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는 올해 25살의 살레하 씨다. 두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한 손으로 갓난아이의 머리를 받치며 공부에 열중이다. 눈이 공책에서 떠나질 않는다.

“전엔 한 번도 글은 써 본적이 없었어요. 연필이 왜 필요한지도 몰랐으니까요. 지금은 제 이름도 쓸 줄 알고, 사인도 만들었어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내 이름뿐 아니라, 책도 읽고, 글도 쓸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녀에게 아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냐고 물었다.
곧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사랑스런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살레하 씨를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은 세계 어느 곳이나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어머니가 깨어 있는 한, 자녀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글을 배우고 싶다는 살레하 씨.
옆에 있는 직원에게 물어보니, 오늘은 “나의” “우리의”라는 글을 배운단다.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벵갈어 고유의 숫자를 사용하기에 숫자를 모르는 여성도 많다. 덕분에 나도 숫자 4를 배웠다. 아라비아 숫자 8이 벵갈어로 숫자 4이다.
한쪽 옆에선 꼬마아이들이 엄마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지 삥 둘러 서있다. 연필로 열심히 메모하는 여자아이가 눈에 띄어 말을 걸었다. 12살이라는 실비. 2학년까지 학교를 다녔지만 지금은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아이는 이 모임시간을 이용해 글을 배운다. 가만히 보니, 이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공장 일을 마치고 왔다는 아이, 집에서 일을 돕다가 왔다는 아이. 모두 배움에 목말라 있다.
 그리고 지금의 허덕이는 가난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대물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머니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연신 고맙다며 손을 쓰다듬는 노모의 거친 손의 느낌이 나의 맘을 더 아프게 했다. 그리고 지금의 허덕이는 가난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대물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머니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연신 고맙다며 손을 쓰다듬는 노모의 거친 손의 느낌이 나의 맘을 더 아프게 했다.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 땅에서의 빈곤과 아픔이 단지 그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제3세계의 빈곤은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시대의 세계 각 곳의 아픔과 어려움은 우리가 함께 안고 가야 할 모두의 문제이다.
더이상 방치하기엔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을 세계 곳곳에서 닥치는 경제문제를 통해 알 수 있지 않나. 나를 바라보기보다, 눈을 들어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지구촌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