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뚜렷하게 사물을 분간할 수 없는 희뿌연 새벽에 눈을 뜹니다.
또 아침이 옵니다.
지난 여름, 줄기찬 비의 공세로 왕성한 세력으로 흐르던 개울물이
얼음장 밑으로 새색시의 발걸음처럼
가만가만 흐르고 있습니다.
어....?
이 신새벽에 조용한 개울물 소리를 가로 막으면서
누군가가 급한 일이 생겼는지 바퀴소리 제법 빠르게
창밖으로 난 작은 소롯길로 차를 몰고 황급히 지나갑니다.
세상일은 저렇게 분주합니다.
저 역시도 저렇게 달려가는 사람 못지않게 세상일에 분주했고 지금도 분주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찰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역시 부족한 인간이기에 때로 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분주한 나날들.......
그러나 참으로 빠른 날들이었습니다.
열살 먹었나 싶은데, 어느새 스무살, 서른....
마흔은 또 얼마나 빨리 지나가던지요.
쉰고개를 지나 예순살로 급히 갑니다.
개울물이 끊임없이 흐르듯,
시간은 쉼이 없습니다.
이 밑엣마을에 나이 지긋하신 어른 한분이 계십니다.
이제 바야흐로 황혼을 맞이하신 그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세상일에 달관하신 듯한 인자한 얼굴.....
그야말로 곱게 나이드신 분의 얼굴입니다.
그 분을 뵐때마다 늘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무런 욕심이나 원망, 회한이 없어 보이는,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듯한 잔잔한 얼굴....
그렇게 곱게 나이들면 더 이상 바램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입니다.
저의 오늘 하루가 곱게 나이 드는데 보탬이 되는 하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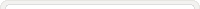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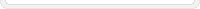










집사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심때문에 세월을 거슬러
올해는 더 젊어 지실꺼예요
지아요!
-대만에서 정해섭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