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리밭가 이름없는 할미무덤, 그 무덤가에 핀 할미꽃 >
보리섞인 멀건 시래기 죽이라도 한그릇 먹고 나오는 집 아이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그도 못먹고 찬물 한사발 들이키고 제 키보다 큰 지게를 지고 나온 집 아이의 누런 얼굴에는
흰색을 띤 마름 버짐이 피어 애처롭다.
열댓살짜리 같은 또래 아이 예닐곱은 동네 어귀에서 서로 모여,
봄이라지만 아직도 잔설이 군데군데 남아 있어 새초롬한 바람이
해진 옷을 입은 소년들의 살갗을 가끔씩 할퀴는 산을 향해 간다.
그러나 내산 남의 산 할 것없이 닥치는대로 나무를 하다보니
가까운 산은 올라보야야 만만하게 할 나무도 없다.
소나무밑에 떨어진 마른 솔잎을 하도 긁어대다 보니
그야말로 산들은 마당바닥처럼 말갛게 되어 비만 내리면
곧바로 붉은 황톳물이 만들어 진다.
그래도 더러 쓸만한 나무가 한두개는 있기 마련인데,
가슴을 두근대며 주인있는 가까운 산에 어쩌다 올라
그 나무를 도끼로 몰래 찍다보면 부라퀴같은 얼굴을 한
산주 영감이 어떻게 알고 오는지 나이답지 않게 헐레벌떡 쫓아와
소년들의 가날픈 멱살을 거머쥐고 고래고래 화를 내면서 혼쭐을 내다보니
웬만한 강심장을 가진 아이 이외에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그러니 좀 멀고 힘들기는 하지만 뱃속 편하게 주인없는 먼 산에 오르는 게 상책이다.
까마득한 먼 산에 가기전에 으레 소년들은 따스한 양지쪽
이름없는 할미무덤가 잔디위에 지게를 받쳐놓고 비스듬히 누워 잠시 쉰다.
지게 목발을 두드리며 어른들에게 귀동냥한 구수한 타령을
그럴싸하게 불러 제껴 보기도 하고,
봄 햇살이 그들을 따스하게 내리쪼이면 춘곤증에 잠시 꾸벅꾸벅 졸기도 한다.
맹물 한사발을 들이키고 온 아이는 허기를 느껴 할미무덤 너머에 핀
진달래 꽃술을 따 먹느라 분주하다.
서너잎씩 따 먹다가 쉬 배가 부르지 않자 한웅큼 모았다가
양볼이 터져라 아귀아귀 먹어도 본다.
그러나 혓바닥만 보라색으로 변할 뿐 허기는 메워지지 않고 횟배만 꼬여 온다.
다시 보리밭으로 들어가 언 땅을 헤치고 용케도 돋아나온
아직은 누런색 잎사귀를 한 냉이를 낫으로 찍어 올려 뿌리에
묻은 흙을 대강 털어내고 입에 넣어 씹어 본다.
그러다가 갑자기 횟배가 꼬여 지게허리에 기대어 아픈 배를 쥐고
아야야 작은 소리를 지르는 소년의 야윈 어깨너머에 할미꽃
서너 송이가 고개를 숙이고 무심히 서 있다.
아니, 한송이는 이미 만개하여 긴 꼬리를 단 씨앗을 허공으로 날려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잠시후 횟배 가라앉은 소년이 할미꽃을 본다. 장난기 어린 소년은
무참하게도 곧 날아갈 준비를 마치고 몸을 빼려고 발돋움을 하는
할미꽃 송이에 동그랗게 머리를 박고 있는 씨앗뭉치를 하나 남김없이
뽑아내어 양손 바닥에 올려놓고 둥글둥글 뭉쳐 본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할미꽃 씨앗뭉치는 화를 낸 듯
씨앗 머리 부분을 바깥으로 내밀고 긴 꼬리부분을
안쪽으로 보내 동그란 탁구공 모양으로 변한다.
큰 발견을 한 듯 소년은 다른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준다.
그러면 너도 나도 할미무덤 너머 멀리까지 뛰어가서
할미꽃 씨를 뽑아와서 뭉쳐 댄다.
동그랗게 변한 할미꽃 씨앗뭉치를 보면서
그들은 이것이 어쩌다 한번씩 소년들의 부모님들이 시오리 장에 가서
큰맘 먹고 사오는 색동색 누깔 사탕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다.
웬만큼 쉬었다 생각된 아이들은 이윽고 차례차례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른다.
땀이나고 숨이 가빠오지만 그들은 어른들보다 더 당차게 산을 오른다.
그러면 높은 산은 그들을 푸근히 맞는다.
그러나 큰 산도 때로는 심술을 부릴 때가 있다.
줄기를 잘라낸 나무 밑둥이 날카롭게 소년들의 해어진
검정고무신을 뚫고 올라와 아직은 여린 소년들의 발바닥을 사정없이 찌르는 것이다.
고무신 안이 아까운 선홍색 피로 흥건하면 나무고 뭐고 다 팽게치고
산 아래로 내달으고 싶지만 소년은 이를 악물고 참는다.
나무를 못하고 집으로 가면 가뜩이나 사나운 의붓어미가
어떤 성화를 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소년들이 너도나도 달려와 쑥을 찾아 돌에 빻아 붙여준다,
낡은 옷자락을 찢어 발을 싸매어 준다 난리를 친 끝에 겨우 피가 멎는다.
그날, 점심밥 대신 진달래 꽃잎과 냉이로 허기를 채우던
횟배앓이 소년은 운 나쁘게 나무등걸에 발은 찔렸지만,
다른 소년들이 다친 소년을 지겟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말라
해놓고는 저마다 한아름씩 베어다 준 나무 덕택에
큰 나뭇단을 지고 절룩거리면서도 신나게 산을 내려 올 수 있었다.
의붓 에미도 다른 날과 달리 더 많은 나무를 지고 온 소년을 모처럼 칭찬해주고,
비록 국물이 더 많은 수제비 국이지만 배불리 주어 저녁을 양껏 먹은 소년은
미소를 머금은 채 흐뭇한 마음으로 단잠을 잤다.
그러나 날이 밝자 소년은 의붓에미 성화에 다시
나무를 하러 먼 산을 가야만 했다.
원래 다른 아이들은 아침밥을 먹고는 나무하러 가지 않고
집안에서 놀다가 점심을 먹고서야 나무를 하러 가는데,
어머니 죽고 의붓에미와 재혼한 아버지마저 삼년전에
원인 모를 병으로 죽고나니 소년의 처지는 그야말로 끈 떨어진 갓 신세가 되었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 거두어 주는 의붓에미가 어쩌면 고마운 존재인 지도 몰랐다.
그런 의붓에미 손에 엉거주춤하고도 어중간하게 눈치밥을 먹고 사는
소년은 점심전에 한번, 점심(밥을 주지 않을 때가 더 많다) 후에 한번,
이렇게 두번은 나뭇짐을 마당에 들여 놓아야 하는 것이다.
풀 죽은 채 홀로 나무를 하러가는 소년의 힘빠진 어깨죽지
너머에는 어쩌면 큰 딸, 둘째 딸의 냉대에 쫓겨 산너머 막내 딸을
찾아가다 얼어 죽은 그 옛날 전설 속의 할머니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를 할미무덤이 어제와 변함없이 산비탈 양지쪽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 할미무덤가에는 어제 낮에 소년들의 손에 무참히 뽑혀 씨앗을
허공에 날려보내지 못한 할미꽃대가 울며 서 있었다.
무덤속에 있는 할머니가 화하여 할미꽃으로 변하고,
다시 그 꽃의 씨앗이 되어 날아서라도 막내딸 집으로 가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한 소년은 갑자기 무덤속에 있는
할머니에게 죄스러운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다.
거기에 덩달아 까닭모를 겁도 약간 났다.
그러나 아지랑이 피어 포근한 봄빛아래 이름없는 할미무덤은 아무런 말이 없다.
그리고 이제는 거진 흙이 다 되어버렸을 소년의 어미와 애비가
살아 생전에 그토록 알뜰히 가꾸며 사랑하던 보리밭에는 찬 바람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꿋꿋하게 자라고 있는 보리가 봄을 맞아 온통 푸르를 뿐이다.
못먹어 빈혈기가 심한 소년의 두 눈앞에
할미꽃과,
할미무덤과,
푸른 보리밭과,
진달래 꽃들과,
소년이 가야할 먼 산이 피어오른 아지랑이와 더불어 순간 어지럽게 일렁인다.
그 푸르고 끝없던 봄이,
어려운 보릿고개가,
의붓에미가,
어미 애비를 다 여윈 불쌍한 소년의 작은 배를
끝없이 고프게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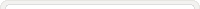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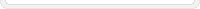










그 나뭇군 소년의 이야기가 한 세대 전에는(이제 두 세대는 지나고 있겠네요)
어디에서나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사람들도 밥술이나 뜨게 되어 이런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들리기만 합니다.
의붓 자식을 제 자식처럼 거두어준 그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할미꽃 아래 한 줌 흙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이 어린 소년이 효성스럽게 모시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