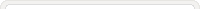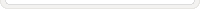글 수 85
또 다시 아침에 출근하여 정신없는 하루가 시작되고 그날 오후시간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치과 병원인데 막내 때문에 시온이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잠깐 오라는 거다.
나는 아내에게 바빠서 못 간다고,
집안일은 알아서 할 수 없냐고,
남들은 남편 출근하면 아내들이 집안일 잘만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매번 오라고 전화하냐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다.
교회에서는 인자한 목사인척하고 학원에서는 자비로운 원장으로 학생들을 맞아서
상담하고 가르치고 얘기하고 회의하는 내가 왜 그런지 가정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아마도 ‘내’ 가족 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지금이라고 별로 좋아진 것도 없지만 집에만 오면
하루 동안 있었던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