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수 1,323
대한민국 국민을 떳떳하게 만들어준 거룩한 희생 (조선일보 사설)

해군 특수전여단 한주호 준위는 사진 속에서 이를 악문 채 성인봉함 갑판에 서 있었다. 한 준위의 잔뜩 찌푸린 눈과 이마는 사랑하는 후배들을 삼킨 서해 바닷속이 지금 얼마나 험악한지, 그 거친 바다 앞에서 그가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담금질하고 있는지를 함께 말하고 있었다.
지난 29일 외신기자 카메라에 잡힌 53세 노병(老兵)의 모습은 군인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 그 자체였다. "하루 잠수하면 이틀 쉬어야 한다"는 안전규정도 바다 밑 캄캄한 어둠에 갇혀 있는 후배들을 살려내려면 1분이 아쉽다는 그를 붙들지 못했다. 그리고 한 준위는 내리 나흘 잠수했다가 싸늘한 몸으로 떠오르고 말았다.
그가 꼭 물 속에 들어가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 지난 35년 수중폭파(UDT) 요원과 교관으로 뛰면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후배들을 배치하고 지휘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2년 뒤 전역을 앞두고 오는 9월 직업보도반에서 바깥세상으로 나설 채비를 시작하는 그에게 부대는 "이제 그만 쉬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조국과 해군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며 잠수복을 입었다.
천안함이 동강나 가라앉은 45m 아래 바닷속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압의 다섯 배, 5기압이 넘어간다. 팽팽한 농구공을 넣으면 5분의 1로 쪼그라드는 압력이다. 거기서 10분만 작업해도 급격히 피로해지고 의식이 가물거린다. 무슨 임무로 바닷속에 내려와 있는지조차 잠깐씩 잊을 정도라고 한다. 수온도 체감온도 영하에 가까운 3.5도다. 머리에 찌릿찌릿한 충격이 오고, 입에 끼우는 호흡기가 얼어붙을 만큼 차갑다. 가뜩이나 흐린 서해 바닷물에 바닥까지 뻘밭이라 손목시계도 보이지 않도록 시야가 뿌옇다.
물살이 1노트, 시속 1.85㎞ 넘으면 잠수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백령도 앞바다 조류(潮流)는 5.3노트로 치달리고 있다. 현장에 달려온 민간 구조대원들이 선체(船體) 근처도 못 가보고 도로 올라와 손을 내젓는 바다였다. 그러나 손주 볼 나이에도 한 준위는 물러서지 않았다. 급히 집을 떠나느라 얼굴도 못 본 아내가 두 차례 전화를 해도 "바쁘니까 내일 전화하겠다"며 끊었을 정도로 몰두했다.
그는 군 생활 평생 "내가 앞장서야 따라온다"고 믿었다. 작년 소말리아 해적을 물리치러 간 청해부대에도 가장 나이 많은 부대원으로 참가해 해적선까지 올라 적을 제압하는 기개를 떨쳤다. 아버지를 따라 육군 장교가 된 아들에게도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이번 구출작전 중에 아들과 한 통화에서 "앞이 안 보여 답답하다. 물살이 너무 세다"고 하면서도 "어떻게든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 준위의 부인은 마른하늘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하고도 몸가짐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었다. 머릿속에 험한 물살과 아버지의 나이가 자꾸만 겹쳐 "이제 그만두시라"고 했다던 장교 아들도 가슴 속에서 고여 넘치려는 슬픔과 아픔을 누르고 반듯하게 서서 추모객을 맞았다. 그런 모자(母子)를 보며 많은 국민이 군인 가족의 모습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한 준위가 살아온 35년 군(軍)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준위의 빈소엔 그동안 해군 당국을 많이 원망하던 실종자 가족들도 찾아와 "죄송하다"며 흐느꼈다. '한주호 준위, 국민은 당신의 거룩한 희생 앞에 거듭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 가슴 속에서 잠시 흔들렸던 군(軍)에 대한 미더움을 되찾게 해준 당신을 향한 고마움을 어찌 나타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군 특수전여단 한주호 준위는 사진 속에서 이를 악문 채 성인봉함 갑판에 서 있었다. 한 준위의 잔뜩 찌푸린 눈과 이마는 사랑하는 후배들을 삼킨 서해 바닷속이 지금 얼마나 험악한지, 그 거친 바다 앞에서 그가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담금질하고 있는지를 함께 말하고 있었다.
지난 29일 외신기자 카메라에 잡힌 53세 노병(老兵)의 모습은 군인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 그 자체였다. "하루 잠수하면 이틀 쉬어야 한다"는 안전규정도 바다 밑 캄캄한 어둠에 갇혀 있는 후배들을 살려내려면 1분이 아쉽다는 그를 붙들지 못했다. 그리고 한 준위는 내리 나흘 잠수했다가 싸늘한 몸으로 떠오르고 말았다.
그가 꼭 물 속에 들어가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 지난 35년 수중폭파(UDT) 요원과 교관으로 뛰면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후배들을 배치하고 지휘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2년 뒤 전역을 앞두고 오는 9월 직업보도반에서 바깥세상으로 나설 채비를 시작하는 그에게 부대는 "이제 그만 쉬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조국과 해군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며 잠수복을 입었다.
천안함이 동강나 가라앉은 45m 아래 바닷속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압의 다섯 배, 5기압이 넘어간다. 팽팽한 농구공을 넣으면 5분의 1로 쪼그라드는 압력이다. 거기서 10분만 작업해도 급격히 피로해지고 의식이 가물거린다. 무슨 임무로 바닷속에 내려와 있는지조차 잠깐씩 잊을 정도라고 한다. 수온도 체감온도 영하에 가까운 3.5도다. 머리에 찌릿찌릿한 충격이 오고, 입에 끼우는 호흡기가 얼어붙을 만큼 차갑다. 가뜩이나 흐린 서해 바닷물에 바닥까지 뻘밭이라 손목시계도 보이지 않도록 시야가 뿌옇다.
물살이 1노트, 시속 1.85㎞ 넘으면 잠수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백령도 앞바다 조류(潮流)는 5.3노트로 치달리고 있다. 현장에 달려온 민간 구조대원들이 선체(船體) 근처도 못 가보고 도로 올라와 손을 내젓는 바다였다. 그러나 손주 볼 나이에도 한 준위는 물러서지 않았다. 급히 집을 떠나느라 얼굴도 못 본 아내가 두 차례 전화를 해도 "바쁘니까 내일 전화하겠다"며 끊었을 정도로 몰두했다.
그는 군 생활 평생 "내가 앞장서야 따라온다"고 믿었다. 작년 소말리아 해적을 물리치러 간 청해부대에도 가장 나이 많은 부대원으로 참가해 해적선까지 올라 적을 제압하는 기개를 떨쳤다. 아버지를 따라 육군 장교가 된 아들에게도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이번 구출작전 중에 아들과 한 통화에서 "앞이 안 보여 답답하다. 물살이 너무 세다"고 하면서도 "어떻게든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 준위의 부인은 마른하늘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하고도 몸가짐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었다. 머릿속에 험한 물살과 아버지의 나이가 자꾸만 겹쳐 "이제 그만두시라"고 했다던 장교 아들도 가슴 속에서 고여 넘치려는 슬픔과 아픔을 누르고 반듯하게 서서 추모객을 맞았다. 그런 모자(母子)를 보며 많은 국민이 군인 가족의 모습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한 준위가 살아온 35년 군(軍)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준위의 빈소엔 그동안 해군 당국을 많이 원망하던 실종자 가족들도 찾아와 "죄송하다"며 흐느꼈다. '한주호 준위, 국민은 당신의 거룩한 희생 앞에 거듭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 가슴 속에서 잠시 흔들렸던 군(軍)에 대한 미더움을 되찾게 해준 당신을 향한 고마움을 어찌 나타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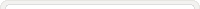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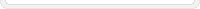










최선을 다한 군인이 아니라 최선 이상을 실천한 대한민국 군인의 거룩한 헌신, 아름다운 희생 앞에 머리가 숙여진다.
나도 앞으로 8년의 세월이 더 흐른다면 이런 헌신과 희생을 위해 몸을 던질 수 있는 내공이 쌓일까?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아내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슬픔 위에
이토록 훌륭한 군인정신을 지닌 한주호 준위를 보내는 국민의 슬픔이 오버랩된다.